【 앵커멘트 】
오늘은 99주년 3.1운동 기념일입니다.
광주ㆍ전남 지역에는 3ㆍ1운동과 학생독립운동을 통해 독립에 앞장선 인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산 윤윤기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 항일민족교육에 앞장선 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입니다.
1939년 보성에 무상교육기관인 '양정원'을 세운 윤 선생은 2천여 명에게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윤종순 / 학산 윤윤기 선생 딸
- "전 재산, 목숨, 전 지식...그런 분을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애국을 하고 누가 교육을 시키겠어요..."
45살 김 혁씨의 할아버지인 향산 김범수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3년의 옥고까지 치렀지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혁 / 향산 김범수 선생 손자
-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어렵게 해내신 일이 그 일 자체조차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
이처럼 광주전남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사가 수천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수는 극히 적습니다.
(CG)
현재 광주전남의 독립유공자 수는 366명, 당시 인구가 비슷했던 경남이 836명, 경북이 869명인것과도 비교됩니다.
당시 광주전남 독립운동 인사 중 상당수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이 유공자 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보훈법상 독립운동 활동과는 별개로 반국가, 반사회 행위의 정황이 있을 경우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갑제 /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장
- "어떤 진영에 섰던지 간에 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 분의 공적만은..."
1년 후면 3.1운동이 일어난 지 백 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인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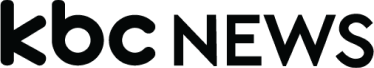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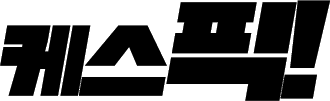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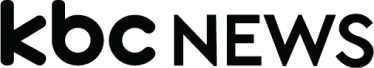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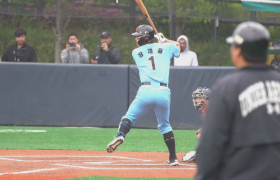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