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18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습니다.
KBC는 43주기를 맞은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15일)은 첫 번째 순서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날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는 김수연 씨.
퇴근길 통근 버스를 덮친 수많은 계엄군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상무대,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그 장소까지.
지난 40년의 기억 대부분은 흩어졌지만, 계엄군의 만행만큼은 몸과 마음 곳곳에 짙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가명)
- "(계엄군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계급이 있고, 한 사람은 계급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요, 내가. 그중 한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체형을 봤어, 체형을. 집을 그때 내가 걸어왔는가 택시를 타고 왔는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정부도.
입을 막고, 귀를 닫고,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스러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가명)
- "5·18은 우리하곤 아무 상관이 없고. 같은 폭행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맞은 사람만 피해자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안 아팠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게 제일 억울한 거 같아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지난 2008년, 용기를 내 성폭력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계만 실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가명)
- "5월은 이제 막 머리 아프든 감기로 아프든 한 달 내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한 4월 중순경부터 6월..두 달을 거의 약으로, 약물로 치료하고."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성폭력 생존자인 이지연 씨와 가족들은 취재진과의 인터뷰 대신 글로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까 싶어 쉬쉬했다",
"그 당시 죽었거나 총을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들러리가 아닌가", 라며 원망스럽고 한이 가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계엄군 성폭력 통계도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51건 가운데 피해자의 거부 등으로 절반 이상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인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설득시켜 가지고 겨우겨우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 뭘 해야 하지, 그 후속조치는 누가 해야 하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지난 2021년, 5·18 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4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물질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이들에 대한 피해 접수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민과, 거듭된 설득 끝에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선 김수연 씨.
자신과 같은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말만큼은 꼭 전달해 달라고 힘주어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가명)
- "여럿이 이제 모인다면 목소리는 내고 싶어요. 같이 나와서 좀..힘을..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동참하고 싶어요."
KBC 정의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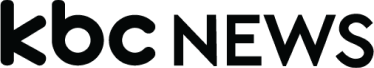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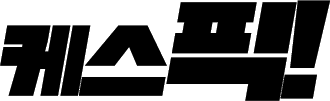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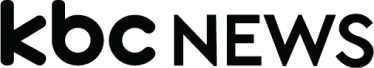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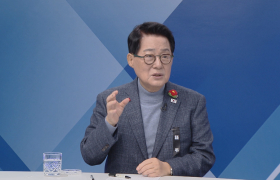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