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기저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1일 80대 여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82년부터 약 7년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02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며 2021년 사망했습니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진폐증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탄광 근무로 진폐증을 앓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았던 만큼 진폐증을 주된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어진 재심사청구 역시 같은 이유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단 측이 B씨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던 사실을 간과한 채 기저질환만을 사망원인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전까지 기저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후유증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진폐증 및 심폐기능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최초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후 사망 직전까지 입·통원 치료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망인의 기저질환 또한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더라도 진폐증 등 폐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단지 사망 장소가 자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B씨의 의료 기록, 시체검안서에 객관적으로 기재된 내용 등을 모두 외면한 것"이라며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폐증의 진행성 악화와 호흡 기능 저하가 사망에 기여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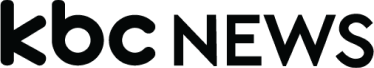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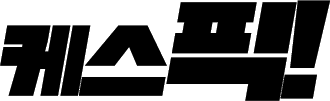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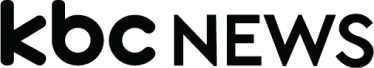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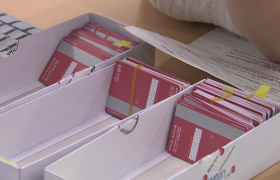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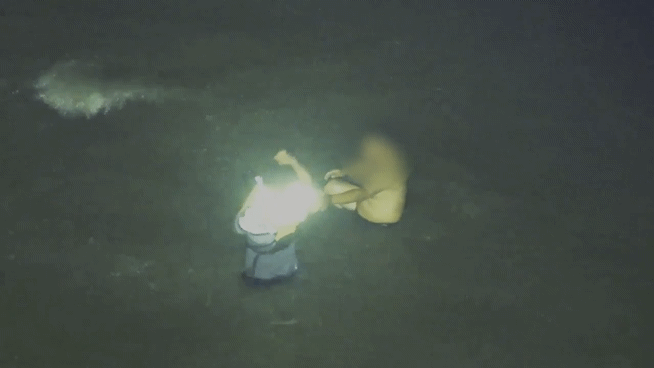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