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 국정원장도 구하지 못하고 김규현 국정원장과 국정원 1, 2 차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실상 경질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선 인사가 망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싼 권력 암투 논란 끝에 국정원 수뇌부가 일괄 교체된 데 대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곪아 터지기 전에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라며 "그래서 '윤석열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다. 이번에도 실패한 인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임명되고 1, 2 차장을 추천하든 팀이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원 인사를 계속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인사가 망사다"라며 "국정원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박 전 원장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원장은 특히 국정원 내부에서 인사 잡음과 하극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밑에 사람들이 원장을 로봇 만들어 가지고 이것 자체가 하극상 아닙니까"라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정원이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곳이 썩더라도 국정원이 썩으면은 되겠어요?"라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에 힘을 안 실어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거냐"는 질문엔 박 전 원장은 "그러니까 실패한 인사죠"라며 "그리고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해서 인사조치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라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이어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 국정원이 한 일이 뭐예요?"라며 "인사 파동, 1 차장 돈 관계 이런 것만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고 김정은이 웃는 거예요. 푸틴이 웃는 거예요. 시진핑이 웃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라고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1년 반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직원들 우리 후배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라고 국정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박 전 원장은 "이러한 훌륭한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고 하면 저는 퇴임한 국정원장과 1, 2 차장을 감찰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퇴임하면 더 이상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감찰을 할 수가 있냐"고 묻자 박 전 원장은 "감찰이 가능하다"며 "왜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고발해 가지고 지금 재판받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들을 국정원장이나 1, 2 차장으로 임명한 인사가 잘못됐다면 빨리 수술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신임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잘못이다"라며 "저는 윤석열 인사가 또 한 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의 인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후임 국정원장은 어떤 자격, 어떤 사람이 가야 되냐"는 질문엔 박 전 원장은 "글쎄요"라며 "현 국정원에서 미국과 정보 관계 시스템을 완전히 급상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좀 조직을 장악하고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이 국정원을 만들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원 #국정원장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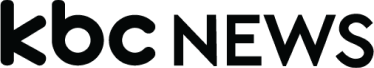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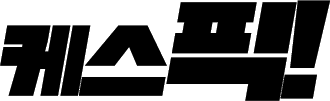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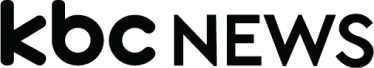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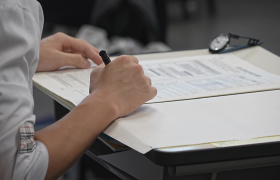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