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역, 니은도 몰랐던 7~80대 노인들이 수 년 동안 한글 공부를 한 끝에 일상과 추억을 담은 시까지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맹에서 시인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이들을 정경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EFFECT
▶ 싱크
- "오디 잎도 다 떨어져 썩고 있당께. 아, 세월이 간다. 잡을 수가 없당께"
이른 아침 앞마당을 내려다 보며 써 내려간 십니다.
행복학습센터에서 시를 쓰고 있는 이 노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이라곤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 날 배운 글자도 돌아서면 잊어버렸다는 노인들,
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시를 써보자는 교사의 제안에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점례 / 한글교실 수강생
- "이렇게 시 쓰라고 하니까 진짜 빠져버리겠다고 선생님한테 몇 번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어느덧 뜨거운 햇볕도, 요란한 천둥소리도, 또 매일같이 하고 있는 농사일도 모두 시가 됐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이 끝나고 다시 자식들을 배웅하며 느끼는 허전함,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대로 배어났습니다.
▶ 인터뷰 : 양양금 / 한글교실 수강생
- "해당화 꽃은 겨울이 되면 져 가지고 봄이 되면 다시 필 수가 있는데 한 번 가신 우리 어머니는 다시 오지 못 하니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출품하는 곡성문학상에서 4명이 당당하게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글공부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던 70~80대 노인들,
이제는 서툰 솜씨로 써내려간 글이 책으로도 출간되면서 어엿한 시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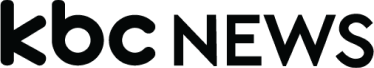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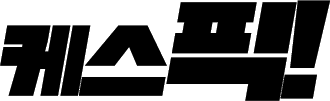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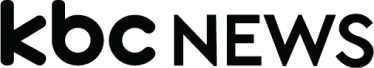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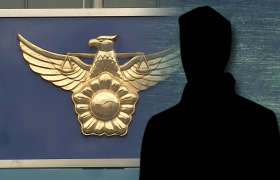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