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과녁 중앙에) 좀 더 가까이 쐈어야 했는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전 슛오프 순간, 김우진(청주시청)은 '3관왕'이 달린 마지막 화살을 쏜 직후 남몰래 탄식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우진은 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대회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전에서 미국의 브레이디 엘리슨을 슛오프 접전 끝에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5세트에서 김우진과 엘리슨은 3발 모두 나란히 10점만 쐈고, 이어진 슛오프에서도 둘 다 10점을 쐈지만 불과 4.9㎜의 한끗 차이로 메달 색이 갈렸습니다.
9일 연합뉴스와 만난 김우진은 당시 순간을 돌아보며 긴장과 안도가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우진은 "5세트에서 내가 먼저 '텐텐텐'(10점 연속 3발)을 쐈다. 이 정도로 엘리슨을 압박했는데, 상대 실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솔직히 90%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엘리슨도 '텐텐텐'으로 응수했습니다.
그 순간 "아…"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는 김우진은 "역시 세계적인 선수는 다르구나. 그래, 슛오프까지 가보자. 이제 더 이상 쏠 화살도 없고, 후회 없이 마지막 한 발을 쏴 보자"고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슛오프 순간. 극도로 긴장했던 김우진의 손을 떠난 화살은 10점과 9점 라인에 걸쳤습니다.
"딱 보는 순간, 하….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쏜 순간 잘 쐈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10점 안쪽 라인에 맞았더라고요. 좀 더 중앙에 붙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엘리슨(은3, 동2)이 올림픽 포디움에 4번 넘게 선 선수인데, (내 화살보다) 좀 더 안쪽에 붙일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저 '기다려보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자'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김우진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슨의 화살도 10점과 9점 사이 라인을 물었습니다.
승패에 대한 판단이 바로 서질 않았다는 김우진은 "'어? 잠깐….' 싶었다. 다시 내 화살을 확인하고는 '이겼다!'며 박성수 감독님과 얼싸안았다"며 전율의 순간을 돌아봤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 직후, 김우진과 엘리슨, 두 감독까지 4명이 손을 맞잡고 관중의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김우진은 "엘리슨이 '네가 오늘 베스트였다'며 내 손을 들어주더라. 올림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 스포츠맨십인 것 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자기와 엘리슨을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비유하면서도 '누가 메시인지'에 대한 답변은 피했던 김우진은 "내가 메시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메시가 좀 더 각광 받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김우진은 엘리슨과 역대 전적에서 9전 7승 2패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4강의 극적인 슛오프 순간도 떠올린 김우진은 "그땐 먼저 10점을 쏜 엘리슨이 본인이 이겼다는 생각에 포효했다. 그다음 내가 엑스텐(10점 정중앙)을 쏴 이겼다"고 돌아봤습니다.
'메시' 김우진에 이어 역시 축구 스타인 킬리안 음바페를 하겠다고 한 이우석(코오롱)과 "난 손흥민"이라고 한 김제덕(예천군청)에 대해선 "음바페와 손흥민은 뉴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죠"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김우진은 "이우석과 김제덕이 양궁의 미래다. 이우석은 완벽한 경기력으로 기량을 증명했고, 김제덕은 자기 실력을 증명하는 한편 계속 발전하는 선수"라며 '세계 최강'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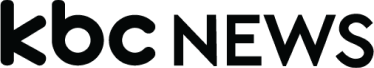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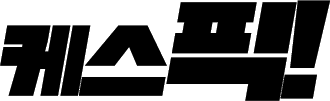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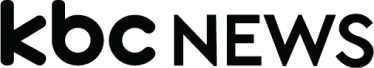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