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난감해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18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미 이란 정부가 굉장한 항의를 하고 있지 않냐”며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다시 대사급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아크부대는 그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버려서 이란은 이란대로 상당히 격분한 상태고 아랍에미리트도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난감한 상황 아닐까 싶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아크부대 격려 방문 당시 “UAE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 다음날 “(윤 대통령이)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의 역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totally unaware)”고 발끈하며 “이 이슈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칸아니 대변인은 당시 오지랖 넓게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메들링(meddling)’을 써가며 윤 대통령의 ‘적’ 발언을 ‘비외교적(undiplomatic)’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의 말실수가 대통령한테 기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뭔가 좀 잘못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외교 행사에서 결례에 가까운 모습이라든지 또는 말실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냐”며 “이거는 두 가지 다 복합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참모진의 부족 하나와, 뭔가 조력이 있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통령의 어떤 태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인 스타일상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고를 받더라도 그걸 무시한다든지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외교적 실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박주민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한국 외교부 설명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떤 답을 해줘야 할 것 같냐”는 질의엔 박주민 의원은 ‘실소’를 터뜨리며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내용으로야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란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답변입니다.
진행자가 “설명이 불가한 사안이냐”고 재차 묻자 박주민 의원은 "설명보다는 아마 물밑에서는 굉장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양국 사이 관계를 완전히 모를뿐 아니라 최근에 어떤 흐름조차도 방해할 수 있는 대형참사이기 때문에 납득을 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듭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서 “아마 물밑에서는 사과를 하고 국내용으로는 설명을 했더니 납득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여 내다봤습니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장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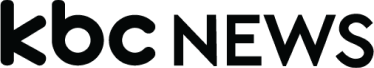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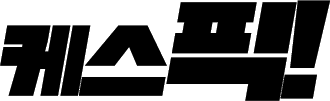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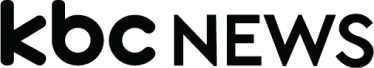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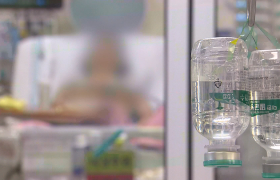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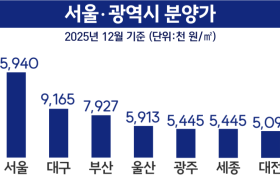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