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적어도 여의도에서 뱃지 달고 국정을 논할 국회의원쯤 되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통찰을 해야 한다"면서 "나는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과 성찰, 그 진지한 고민 끝에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언행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과거처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고 막걸리 마시고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이니까 그거보다는 SNS에 집중을 한다"면서 "자극적인 말 한마디 던지고 거기에 열광하는 거에 좀 심취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여의도만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대통령실도 그러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역시도 깊은 통찰이나 스스로에 대한 성찰 같은 거는 요즘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취임할 땐 야당과 협치 하겠다, 마음을 열겠다 그랬지만 지금 한 번도 야당 대표랑 만난 적도 없고 일상적인 대화가 여야 간에 사라지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 출범 한 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 대표로서의 한계가 있다"면서 "전당대회를 김기현 대표 자신의 리더십이나 자신의 영향으로 뚫고 온 게 아니고 용산의 지원으로 그냥 무임승차하고 등극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옛날엔 여당보고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출장소가 아니고 한 대리점쯤 된 것 같다"면서 "대표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가 가지고 만찬 하면서 대통령과 격주로 독대하겠다 했지만 한 달 됐는데 안 하고 있어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등 법안에 대해 여야 간 대화에 대해 조 의원은 "본회의 직상정에 하겠다고 하는 혹은 했던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 토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없었다"면서 "국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169석 절대다수 야당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여당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적임자에 대해 조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방탄정당, 팬덤 정당, 이재명 당대표 사당화라고 보는데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그건 기본이다"면서 "지금 대표나 당 지도부와는 뭔가 다르면서도 그 자체로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당 지도부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시야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언제 내려질 것인가, 내려지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그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무죄 인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여진다"면서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도 최근에 기소가 됐는데 사건의 사이즈나 난이도를 볼 때 굉장히 많은 논박이 법정 안에서 이뤄진 걸로 보여지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뭐가 더 나올 것인가 어떤 팩트들이 나올 것인가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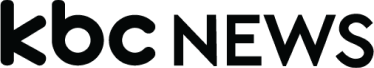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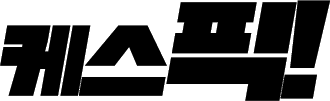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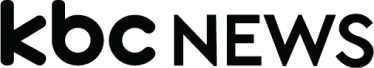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