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형 교수는 오늘(27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최악은 피했지만 실익은 없다”라고 총평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현상 변경 문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주요 의제의 하나인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워싱턴선언’에 NCG(핵 협의그룹) 창설을 명시화한 것은 나름 의미는 있지만, 한국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핵 공유’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NCG(nuclear consultation group)는 ‘컨설테이션(consultation)’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그냥 옆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NPT(핵확산금지조약)라는 제약조건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미국이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놓은 것이 바로 NCG(핵 협의그룹) 창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공격 부분에 우리가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핵 확장 억제를 제도화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미국이 NCG(핵 협의그룹)를 만들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울타리를 친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핵 확장억제는 동맹의 신뢰에 기반하는데 아무리 핵 운용을 하더라도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핵 공격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어떤 의미에서 핵우산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0% 확인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핵 공유나 이런 부분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언급에 대해 “중국이 비판은 하겠지만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법 등 규제완화와 관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발언한 데 대해, 김 교수는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염두에 둔 미국 국내용 발언이다”고 해석하면서 “사실 우리는 투자만 하고 실질적으로 불공정 무역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반칙 행위를 하니까 같은 진영의 나라끼리 협력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같은 진영 내에서는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되잖냐”고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기업 넷플릭스와 코닝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찾아온 투자”라면서 “우리에게 어렵고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것들을 협상에서 얻는 게 진정한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느냐’는 미국 NBC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미국 측 도감청에 대해 선의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한데 대해, 김 교수는 “미국 도감청 문제는 협상의 지렛대인데 왜 사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답하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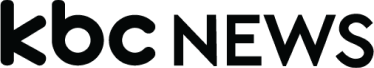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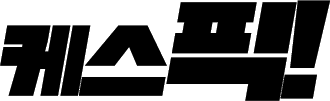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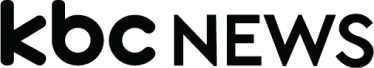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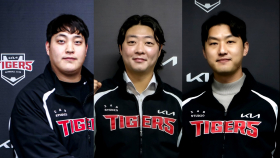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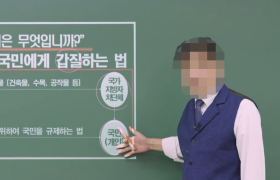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