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없이 최대 29시간 가까이 일하고, 구두계약 관행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제작인력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9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출·제작을 담당하는 PD는 주 56시간, 방송작가는 주 52.6시간, 현장미술은 주 50.5시간, 현장기술은 주 46.3시간 일했습니다.
방송제작 환경 특성상 몰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최대 연속 노동시간도 길었습니다. 업무 투입부터 마감 시까지 퇴근 없이 근무한 최대 연속 노동시간 평균은 19.7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PD는 평균 28.6시간, 작가는 평균 23.4시간 퇴근하지 못하고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예능 PD는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주 60시간은 넘는다. 하루 쉬면 정말 잘 쉬는 주이고, 대부분은 하루도 못 쉰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계약 관행도 취약했습니다. 구두계약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4.4%에 달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파견 비중이 큰 방송작가(41.0%)와 현장기술 직군(46.0%)에서 구두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계약을 하더라도 3분의 1은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근로계약이 39.1%, 프리랜서 계약이 34.2%, 하도급 10.2%, 용역 2.9% 순이었습니다.
현장기술 24년차 종사자는 “보통 구두로 계약한다. 계약서를 잘 안 써주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고용 안정성은 낮았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 경험이 있다는 방송제작인력은 9.2%였고, 방송작가는 19.9%, PD는 15.9%가 해고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시청률 저조로 인한 조기종영,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감축 등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는 “시청률이 안 나오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고용 안전성에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51.2%로 절반을 넘었고, 방송작가의 84.0%가 고용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보상 수준은 정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3년 기준 방송제작인력의 세전 평균 연봉은 4,31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5년차 시사교양 PD는 “제작사 재정에 한계가 있어 연차가 쌓여도 조금씩밖에 오르지 않는다. 10년 정도 되면 거의 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송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제작인력의 최소 노동 기준 마련과 실태조사의 정례화·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합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 4,0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달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 등을 만나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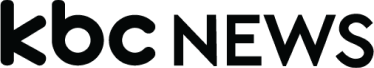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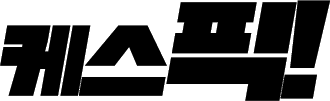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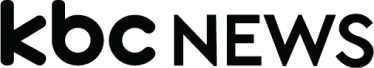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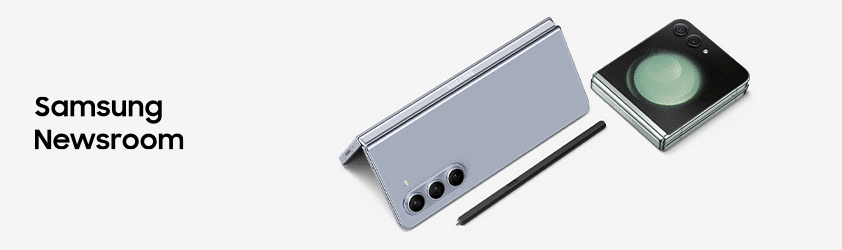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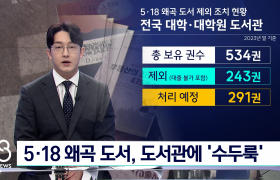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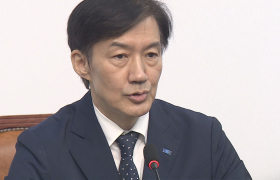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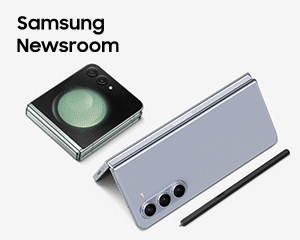


























댓글
(0)